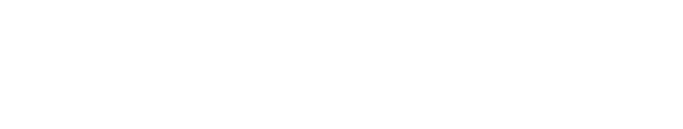2025년도 상반기 학생회 감사(이하 감사)에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주의·경고 조치가 기록됐다. 지난해 주의·경고 조치는 각각 12건, 5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무려 85건, 3건으로 급증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총학생회를 포함한 33개의 단과대학·트랙·학과(부) 학생회가 징계 대상이 됐다.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중앙감사위원회는 감사 기준 강화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고 단위별 학생회는 준비 과정에서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감사 관리 주체인 총대의원회도 감사 OT,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안내했으나,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서 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감사는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가’를 말하며 끝낼 일이 아니라, 학생자치 운영의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 당선 후 사업 및 예산 사용 계획과 집행 등의 과정에서 미처 관리하지 못한 균열을 발견하고 반복되는 오류를 체계적으로 줄여가는 과정이 바로 감사의 본질이니 말이다. 결국 시정을 요구하며 공동체의 자정을 이끄는 동시에 학생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취재 결과 확인된 학생회의 사업·예산 운영은 다층적인 허점을 안고 있는 듯하다. 학생자치 과정이 애초부터 위계적 전달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단위별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사업과 예산안을 마련해 상위 기구에 보고하고,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가 이를 검토한다. 상위 기구가 적절성을 확인한 뒤 방향을 정하면, 단과대학을 거쳐 다시 하위 기구로 흘려보낸다. 총대의원회 역시 각 기구에 획일적인 감사 지침을 전달한다. 감사 전후로 확인된 사항이 결과 통보에 그치니, 이 안에서 각 단위 학생회가 사업의 성과와 문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며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장치가 과연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학생자치는 학생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 ‘위임된 권력’이 아니라 ‘공동의 참여’에 있기 때문이다. 경험과 성과, 때로는 실패까지 공유하며 배우는 과정 속에서 자치의 의미가 선명해진다. 행정기관은 위계와 효율로 운영될 수 있지만, 학생자치는 구성원들의 합의와 교류를 통해서만 정당성을 확보한다. 동등하지 않으면 자치라는 이름은 공허해지고, 남는 것은 껍데기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되돌아오는 장치임을 증명하는 일이다. 결국 학생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한, 그 어떤 구호도 학생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설득력은 수사가 아니라 구조에서, 구호가 아니라 행동에서 비롯된다. 학생자치가 메아리 없는 독백에 머무를 것인가 혹은 신뢰와 공감의 무대를 불러낼 것인가. 학생자치가 살아 있는 힘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학생회가 스스로의 무게를 깨닫길 바란다.
이승희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