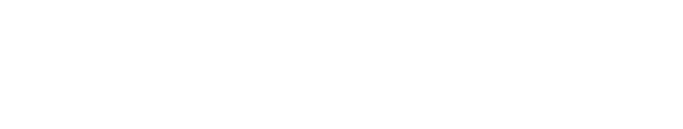국립중앙박물관(이하 국중박)의 인기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올해만 벌써 500만 명이 넘는 관람객 수를 기록할 정도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관람자 수였던 295만 명에서 약 70% 증가한 수치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관람객 수를 동원했다.
필자도 국중박 현장 취재에 동행했다. 오랜만에 방문한 국중박은 기존에 인식하던 ‘박물관’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유물을 보기만 하는 것을 넘어 생동감 있게 전시를 느낄 수 있었다. 박물관 내부에 턱을 없애 통행에 불편함을 없애는 등 누구나 편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도 인상 깊었다.
이러한 인기 속에서 국중박 입장료 유료화가 대두되고 있다. 무료로 전시를 관람하는 우리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전시를 관람하는 것은 낯설 테다. 하지만 박물관은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국중박의 ‘2025년도 예산각목명세서’에 따르면 올해 국중박 운영을 위한 세출은 829억 원이었던 반면, 세입은 23억 원에 불과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간송 전형필 선생의 유물이 경매에 출품됐으나 국중박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응찰하지 못했다.
혹자는 국중박의 흥행 원인 중 하나인 박물관 상품 ‘뮷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익은 국중박과 무관하다. 국중박의 별도 기관인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운영·관리하는 탓이다. 유료화가 더욱 필요한 이유다.
해외에서는 박물관 입장료 부과와 더불어 다방면으로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성인 기준 약 22유로(한화 약 3만 6천 원)의 입장료를 부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한다. 그럼에도 2024년 한 해에만 87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
국중박은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명목하에 전시를 2008년부터 무료로 전환했다. 누구나 자유롭게 유물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변화로 볼 수 있다. 유물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를 미래 세대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입장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바로 그 의무의 실천이자 후대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투자로 작용할 수 있을 테다. 그렇다면 필자부터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김연우 기자